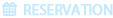해저이야기사이트 ≪ 74.rmq138.top ≪ 양귀비게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래란정 작성일25-04-17 21:5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86.ree337.top
0회 연결
http://86.ree337.top
0회 연결
-
 http://23.rcw939.top
0회 연결
http://23.rcw939.top
0회 연결
본문
【62.rmq138.top】
무료충전 바다이야기야마토 창공최신 릴게임바다이야기 릴게임
바다이야기먹튀돈받기 알라딘릴게임 사이트 꽁머니사이트 바둑이라이브 릴게임임대 무료신천지게임 무료 슬롯 머신 카지노 게임 신야마토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황금성 파칭코 어플 현금게임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바다이야기 기프트 전환 슬롯게시판 야마토릴 황금성게임사이트 슬롯 프라 그마 틱 무료체험 릴게임 공략법 오션파라 다이스다운 배터리게임 야마토온라인주소 오션파라다이스게임다운로드 pc야마토게임 프라그마틱무료메타2 황금성잭팟 바다이야기 시즌7 야마토5게임방법 황금성3 바다이야기기계 무료충전바다이야기 백경게임예시 야마토게임공략법 슬롯게임 실시간 무료 슬롯 머신 카지노 게임 릴게임야마토 바다이야기 예시 종료 오리 지날 바다 사이다쿨게임 실시간바둑이 야마토게임2 모바일릴게임사이트 오션파라다이스게임하는법 오징어릴게임 슬롯게임 실시간 릴게임임대 황금성게임다운받기 야마토 무료 게임 바다이야기2 온라인파칭코 인터넷손오공게임 파친코게임 알라딘다운로드 한게임바둑이게임 파칭코 게임 릴 야마토 알라딘설명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오션파라다이스 황금성잭팟 온라인야마토2 뽀빠이놀이터 파칭코슬롯 야먀토5 오리지날바다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파일 안전 슬롯사이트 무료슬롯체험 체리마스터 pc용 다빈치무료릴게임 바다이야기게임2018 무료 황금성게임 팡멀티릴게임 황금성나비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안전검증릴게임 인터넷 바다이야기 온라인릴게임 먹튀 검증 검증완료릴게임 신천지3.0 하이로우하는법 황금성검증 황금성게임랜드 릴게임사이다 뽀빠이릴게임 백경게임다운로드 한국파친코 슬롯무료체험 바다이야기게임하는방법 바다이야기 시즌7 빠칭코 한국파친코 신천지인터넷게임 황금성 게임 온라인 야마토 게임 황금성용가리 알라딘체험머니 알라딘릴게임다운로드 황금성3 사설바둑이 게임바둑이추천 사이다쿨게임 럭키세븐 야마토2 온라인 런처 인터넷 바다이야기 창원경륜경륜장 사설경정 바다이야기 백경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바다슬롯 먹튀 바다이야기 무료체험 꽁머니릴게임 야마토게임공략 법 무료황금성게임 온라인삼국지 슬롯머신 원리 바다이야기 상어 최신 인터넷게임 우주전함야마토2202 오락실게임 강원랜드슬롯머신 모바일 릴게임 릴게임알라딘주소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53> 고성 문암리 밭 이랑 유적
편집자주
우리 역사를 바꾸고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한 발견들을 유적여행과 시간여행을 통해 다시 한번 음미한다. 고고학 유적과 유물에 담겨진 흥분과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함께 즐겨보자.
한반도에서 신석기시대에 이미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했음을 보여주는 동아시아 최고(最古) 경작유구(耕作遺構)가 강원 고성의 문암리 유적에서 확인됐다. 사진은 밭 유적 전경(남-북 방향)이며 사진 위쪽으로 옛 주거지 터가 보인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공
육아비한반도에서 농사 활동은 언제 시작됐을까? 선사고고학의 뜨거운 화두 중 하나다. 농경은 인류 문화사를 바꾼 대사건이다. 그저 주변 음식을 채집하고 사냥했던 이전 생활의 모든 것을 바꾸었고, 동시에 문명으로 진화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발판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신석기시대 이랑 개별주택가격열람 과 고랑이 남아 있는 밭이 1997년 문암리(강원 고성군)에서 발견됐다.(사적 제426호) 이랑짓기 농법은 발달한 형태의 경작법이다. ‘채집과 물고기잡이로 살았다’라고만 생각했던 한반도의 신석기시대 문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고고학자들 머릿속에는 ‘그 시절 바닷가 마을에서 그리 발달한 농법이 사용됐을까?’ ‘신석기시대 임대아파트 전세 동해안 문화가 달랐던 것인가?’라는 질문이 맴돌고 있다.
바다를 수줍어하는 바다 마을
동해안에는 곳곳에 바닷가 솔밭이나 바다를 굽어보는 작은 언덕이 명승을 이룬다. 거기에 호수까지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 절경이다. 동해안을 타고 흐르는 7번 bis 국도에 이런 명승지가 모여 있다. 김일성, 이승만 그리고 이기붕의 별장이 있는 화진포도 좋지만, 고성 문암리 일대도 빠지지 않는다. 작은 반달형 모래 해변이 이어지고 북쪽으로 송지호가 있다. 문암리 마을과 모래 해변 사이에 작은 산이 있는데 바로 서쪽 사면 아래 사주에 문암리 신석기시대 마을 유적이 있다.
바닷가 마을이라곤 하지만, 오히 소득 7분위 이하 려 바다를 수줍어하듯 작은 산 뒤에 숨은 모양새다. 이 산이 해풍과 큰 파도를 막아주니 살기에 좋았을 것이다. 이곳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 7기와 야외 불 자리들이 발견됐다. 철조망과 ‘사적’ 표시 간판 외엔 아직도 유적임을 보여주는 시설이 없어 아쉽기는 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잔디밭이 여백처럼 선사시대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육지에서 가장 오래된 1세대 토기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토기 장식 변화를 큰 틀에서 설명하자면, 제주 고산리에서 출토된 풀잎을 섞어 만든 토기가 가장 오래된 1세대 토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문암리나 오산리(강원 양양군) 유적의 아주 이른 유적 층위에서 발견되는 무문양토기나 붉은색으로 반질반질하게 만든 표면에 시문구로 도장처럼 꾹꾹 눌러서 문양을 장식한 적색마연압날문토기(赤色磨硏壓捺文土器)가 가장 오래된 토기다. 또 바닥이 납작한 덧띠무늬토기가 이어 등장한 2세대 토기이고, 우리가 신석기시대 대표적 토기로 알고 있는 빗살무늬토기는 3세대에 해당한다. ‘세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1세대와 3세대는 무려 수천 년의 시간차가 있다. 요즘 전자기기의 진화를 의미하는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간 폭이다.
문암리 유적의 하부층(기원전 4,000년경)에서 2세대 토기(덧띠무늬토기)가 나타나지만 상부층에서는 한반도 서해안 지역에서 동해안으로 확산된 3세대 토기(빗살무늬토기)가 성행하고 2세대 토기는 사라진다. 아마도 족히 2,000년은 걸렸을 것이다. 문화적 ‘서풍’이라도 분 것일까?
2세대 토기는 한반도 동해안과 남해안의 유적층에서 보이지만 서해안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2세대 토기는 우리나라 동해안뿐 아니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와 만주 북부 지역의 아주 이른 시기(약 1만2,000년 전)부터 보이기 때문에, 문화의 흐름과 사람의 이동을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동해안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흘러온 문화라고 보는데, 문암리는 바로 중간 지점에서 나타나는 극동의 ‘동풍’ 문화유적인 셈이다.
문암리에서 출토된 옥으로 만든 고리형 귀걸이(사진 가운데)와 각종 석기.
남북으로 부는 문화 바람, ‘동풍’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주를 포함하는 동해안 신석기시대 문화의 ‘동풍’, 즉 ‘동해 스타일’,은 비단 토기만이 아니다. 덧띠토기 문화와 함께 발굴된 옥제결상이식(玉製玦狀耳飾·옥으로 만든 고리형 귀걸이)들이 동해안과 남해안의 여러 유적에서 발견된다. 납작하게 둥근 원형으로 갈아서 만든 옥제품으로 한쪽에 잘린 틈이 있는데, 중국 랴오닝성의 흥륭와(興隆窪) 유적이나 일본 고후(國府) 조몬시대 무덤 유적으로 봤을 때 분명 ‘귀걸이’로 추정된다. 문암리에서 2점이 발굴됐는데 거의 똑같은 모양의 옥제품이 아무르강 유역에서도 기원전 8,000년경에 나타나고, 동일한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제주 고산리유적에서도 발견된다. 결국 ‘문화 동풍’의 영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아무르강 남쪽 헤이룽장성에 옥 생산지가 많고, 최근 북만주 샤오난샨(小南山)유적의 무덤에서도 기원전 7,000년경의 옥 제품이 발견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암리 조합식 낚싯바늘의 자루 부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공
문암리 유적에서 출토된 ‘조합식 낚싯바늘’ 역시 동해 연안의 특산품이라 할 만하다. 무른돌을 갈아 낚싯바늘의 긴 축을 만들고 여기에 뼈나 나무로 만든 고리를 붙여서 만들었는데, 동해 연안의 여러 신석기 유적에서 발견된다. 특히 문암리에서는 예술 작품 수준으로 잘 만들어진 특별한 석기들이 여러 점 나왔다.
또 문암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 얼굴 조각들도 ‘동풍 문화’라 할 만하다. 오산리 선사 유적의 심벌인 인면(人面) 토기뿐 아니라, 아무르강의 신석기 유적, 간도와 두만강 하구의 굴포리 유적, 부산 동삼동 유적 등에서도 사람 얼굴 조각이 출토됐다. 이 분포도를 보노라면, 동풍에 ‘얼굴 숭배 사상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문암리 유적에서 백두산 원산지로 추정되는 흑요석이 출토된 것도 이런 흐름의 증거다.
문암리에서 출토된 흑요석제 석기. 백두산 지역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공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물론, 선사시대에도 한반도 남북을 가로지르는 백두대간으로 인해 동-서 간 교통이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쪽에서 시작된 빗살무늬토기 문화는 동쪽으로 백두대간을 넘어 이동했는데, ‘동풍’ 덧띠무늬토기 문화는 서쪽으로 불지 않았을까? 왜 동쪽에서만 오래된 토기들이 보일까? 한반도 선사시대 연구의 화두들이다.
문암리에서 출토된 토기에서 식물 씨앗이 눌린 자국(노란 점)이 발견됐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신석기시대 어부도 농사를 지었을까?
서해안의 제3세대 토기 유적인 황해도 지탑리 유적에서는 불에 탄 조와 돌로 만든 농경 도구들이 발견되는 등 이미 기원전 4,000년 전에 초기 농경을 했던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이랑 밭이 발견된 적은 없다. 물론, 이랑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시 이랑짓기 농경 문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도 남해안 섬에는 어부가 뱃일을 하지 않는 시간엔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다. 신석기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문암리 유적에서 나오는 돌 도구 재료 중에는 수십㎞ 떨어진 곳에서 생산되는 것들도 있으니, 경제생활의 반경이 넓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산, 강, 호수 그리고 바다가 지척에 있는 이 지역은 어로와 채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 인구가 증가하면, 더 안정적인 생산 방식인 농경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문암리 오산리 등 동해안 이 일대의 유명한 신석기 유적에서는 중기 이후 분명 농사를 짓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실제로 송전리 유적에서도 흙덩어리에 조, 기장, 수수 등이 들어 있고, 팥의 흔적도 있는 등 곡물이 이미 일상적인 식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문암리 주거지 발굴 및 층위 단면 모습.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공
문암리 밭이랑, 경작 혁명의 흔적?
선사시대 밭에 이랑이 있는 모습은 발굴자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이랑과 고랑이 교차하는 광경은 선사시대의 멈춘 시간을 보는 듯한 감동을 일으킨다.
문암리 유적에서는 두 개 층에서 밭이랑이 발굴됐다. 위층의 이랑은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래층은 신석기 중기(기원전 3,600년~기원전 3,000년)의 주거지 1기가 밭이랑을 파고 만들어진 것으로 미뤄, 적어도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진 밭 유적으로 추정된다. 문암리 밭이랑이 발견되기 이전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밭 유적 중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은 청동기시대(기원전 1,500년~기원전 400년)의 밭 유적이었으니, 이보다 무려 2,000년이나 앞서는 이랑과 고랑 밭이 발견된 셈이다.
토기 표면의 눌린 자국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모습. 기장으로 추정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공
또 문암리에서는 불에 탄 콩이나 밀 종류의 종자, 도끼에 찍혀 있는 들깨 종자의 흔적, 그리고 탄화미가 한 알씩 발견됐다. 수수, 기장, 조 등 널리 재배됐던 곡물을 넘어선 곡물 종류다.
이렇듯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먼 시기의 신석기 어촌 유적에서 밭이랑 유구가 발견된 데 대해 논란이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석기시대 이랑 밭 농경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분석의 결과는 당시의 곡물 재배 범위나 기술이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석기시대는 단순한 채집과 사냥이 아닌, 훨씬 발전된 경제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 현대 고고과학은 구석기시대 동굴의 흙 속에서 유전자를 찾아 고인류의 모습까지 그려내고 있다. 더 나아가 문암리 사람들의 당시 생활을 더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길 기대한다.
배기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한양대 명예교수
무료충전 바다이야기야마토 창공최신 릴게임바다이야기 릴게임
해저이야기사이트 ≪ 1.rmq138.top ≪ 양귀비게임
해저이야기사이트 ≪ 13.rmq138.top ≪ 양귀비게임
해저이야기사이트 ≪ 56.rmq138.top ≪ 양귀비게임
해저이야기사이트 ≪ 10.rmq138.top ≪ 양귀비게임
바다이야기먹튀돈받기 알라딘릴게임 사이트 꽁머니사이트 바둑이라이브 릴게임임대 무료신천지게임 무료 슬롯 머신 카지노 게임 신야마토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황금성 파칭코 어플 현금게임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바다이야기 기프트 전환 슬롯게시판 야마토릴 황금성게임사이트 슬롯 프라 그마 틱 무료체험 릴게임 공략법 오션파라 다이스다운 배터리게임 야마토온라인주소 오션파라다이스게임다운로드 pc야마토게임 프라그마틱무료메타2 황금성잭팟 바다이야기 시즌7 야마토5게임방법 황금성3 바다이야기기계 무료충전바다이야기 백경게임예시 야마토게임공략법 슬롯게임 실시간 무료 슬롯 머신 카지노 게임 릴게임야마토 바다이야기 예시 종료 오리 지날 바다 사이다쿨게임 실시간바둑이 야마토게임2 모바일릴게임사이트 오션파라다이스게임하는법 오징어릴게임 슬롯게임 실시간 릴게임임대 황금성게임다운받기 야마토 무료 게임 바다이야기2 온라인파칭코 인터넷손오공게임 파친코게임 알라딘다운로드 한게임바둑이게임 파칭코 게임 릴 야마토 알라딘설명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오션파라다이스 황금성잭팟 온라인야마토2 뽀빠이놀이터 파칭코슬롯 야먀토5 오리지날바다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파일 안전 슬롯사이트 무료슬롯체험 체리마스터 pc용 다빈치무료릴게임 바다이야기게임2018 무료 황금성게임 팡멀티릴게임 황금성나비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안전검증릴게임 인터넷 바다이야기 온라인릴게임 먹튀 검증 검증완료릴게임 신천지3.0 하이로우하는법 황금성검증 황금성게임랜드 릴게임사이다 뽀빠이릴게임 백경게임다운로드 한국파친코 슬롯무료체험 바다이야기게임하는방법 바다이야기 시즌7 빠칭코 한국파친코 신천지인터넷게임 황금성 게임 온라인 야마토 게임 황금성용가리 알라딘체험머니 알라딘릴게임다운로드 황금성3 사설바둑이 게임바둑이추천 사이다쿨게임 럭키세븐 야마토2 온라인 런처 인터넷 바다이야기 창원경륜경륜장 사설경정 바다이야기 백경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바다슬롯 먹튀 바다이야기 무료체험 꽁머니릴게임 야마토게임공략 법 무료황금성게임 온라인삼국지 슬롯머신 원리 바다이야기 상어 최신 인터넷게임 우주전함야마토2202 오락실게임 강원랜드슬롯머신 모바일 릴게임 릴게임알라딘주소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53> 고성 문암리 밭 이랑 유적
편집자주
우리 역사를 바꾸고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한 발견들을 유적여행과 시간여행을 통해 다시 한번 음미한다. 고고학 유적과 유물에 담겨진 흥분과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함께 즐겨보자.
한반도에서 신석기시대에 이미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했음을 보여주는 동아시아 최고(最古) 경작유구(耕作遺構)가 강원 고성의 문암리 유적에서 확인됐다. 사진은 밭 유적 전경(남-북 방향)이며 사진 위쪽으로 옛 주거지 터가 보인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공
육아비한반도에서 농사 활동은 언제 시작됐을까? 선사고고학의 뜨거운 화두 중 하나다. 농경은 인류 문화사를 바꾼 대사건이다. 그저 주변 음식을 채집하고 사냥했던 이전 생활의 모든 것을 바꾸었고, 동시에 문명으로 진화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발판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신석기시대 이랑 개별주택가격열람 과 고랑이 남아 있는 밭이 1997년 문암리(강원 고성군)에서 발견됐다.(사적 제426호) 이랑짓기 농법은 발달한 형태의 경작법이다. ‘채집과 물고기잡이로 살았다’라고만 생각했던 한반도의 신석기시대 문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고고학자들 머릿속에는 ‘그 시절 바닷가 마을에서 그리 발달한 농법이 사용됐을까?’ ‘신석기시대 임대아파트 전세 동해안 문화가 달랐던 것인가?’라는 질문이 맴돌고 있다.
바다를 수줍어하는 바다 마을
동해안에는 곳곳에 바닷가 솔밭이나 바다를 굽어보는 작은 언덕이 명승을 이룬다. 거기에 호수까지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 절경이다. 동해안을 타고 흐르는 7번 bis 국도에 이런 명승지가 모여 있다. 김일성, 이승만 그리고 이기붕의 별장이 있는 화진포도 좋지만, 고성 문암리 일대도 빠지지 않는다. 작은 반달형 모래 해변이 이어지고 북쪽으로 송지호가 있다. 문암리 마을과 모래 해변 사이에 작은 산이 있는데 바로 서쪽 사면 아래 사주에 문암리 신석기시대 마을 유적이 있다.
바닷가 마을이라곤 하지만, 오히 소득 7분위 이하 려 바다를 수줍어하듯 작은 산 뒤에 숨은 모양새다. 이 산이 해풍과 큰 파도를 막아주니 살기에 좋았을 것이다. 이곳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 7기와 야외 불 자리들이 발견됐다. 철조망과 ‘사적’ 표시 간판 외엔 아직도 유적임을 보여주는 시설이 없어 아쉽기는 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잔디밭이 여백처럼 선사시대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육지에서 가장 오래된 1세대 토기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토기 장식 변화를 큰 틀에서 설명하자면, 제주 고산리에서 출토된 풀잎을 섞어 만든 토기가 가장 오래된 1세대 토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문암리나 오산리(강원 양양군) 유적의 아주 이른 유적 층위에서 발견되는 무문양토기나 붉은색으로 반질반질하게 만든 표면에 시문구로 도장처럼 꾹꾹 눌러서 문양을 장식한 적색마연압날문토기(赤色磨硏壓捺文土器)가 가장 오래된 토기다. 또 바닥이 납작한 덧띠무늬토기가 이어 등장한 2세대 토기이고, 우리가 신석기시대 대표적 토기로 알고 있는 빗살무늬토기는 3세대에 해당한다. ‘세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1세대와 3세대는 무려 수천 년의 시간차가 있다. 요즘 전자기기의 진화를 의미하는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간 폭이다.
문암리 유적의 하부층(기원전 4,000년경)에서 2세대 토기(덧띠무늬토기)가 나타나지만 상부층에서는 한반도 서해안 지역에서 동해안으로 확산된 3세대 토기(빗살무늬토기)가 성행하고 2세대 토기는 사라진다. 아마도 족히 2,000년은 걸렸을 것이다. 문화적 ‘서풍’이라도 분 것일까?
2세대 토기는 한반도 동해안과 남해안의 유적층에서 보이지만 서해안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2세대 토기는 우리나라 동해안뿐 아니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와 만주 북부 지역의 아주 이른 시기(약 1만2,000년 전)부터 보이기 때문에, 문화의 흐름과 사람의 이동을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동해안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흘러온 문화라고 보는데, 문암리는 바로 중간 지점에서 나타나는 극동의 ‘동풍’ 문화유적인 셈이다.
문암리에서 출토된 옥으로 만든 고리형 귀걸이(사진 가운데)와 각종 석기.
남북으로 부는 문화 바람, ‘동풍’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주를 포함하는 동해안 신석기시대 문화의 ‘동풍’, 즉 ‘동해 스타일’,은 비단 토기만이 아니다. 덧띠토기 문화와 함께 발굴된 옥제결상이식(玉製玦狀耳飾·옥으로 만든 고리형 귀걸이)들이 동해안과 남해안의 여러 유적에서 발견된다. 납작하게 둥근 원형으로 갈아서 만든 옥제품으로 한쪽에 잘린 틈이 있는데, 중국 랴오닝성의 흥륭와(興隆窪) 유적이나 일본 고후(國府) 조몬시대 무덤 유적으로 봤을 때 분명 ‘귀걸이’로 추정된다. 문암리에서 2점이 발굴됐는데 거의 똑같은 모양의 옥제품이 아무르강 유역에서도 기원전 8,000년경에 나타나고, 동일한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제주 고산리유적에서도 발견된다. 결국 ‘문화 동풍’의 영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아무르강 남쪽 헤이룽장성에 옥 생산지가 많고, 최근 북만주 샤오난샨(小南山)유적의 무덤에서도 기원전 7,000년경의 옥 제품이 발견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암리 조합식 낚싯바늘의 자루 부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공
문암리 유적에서 출토된 ‘조합식 낚싯바늘’ 역시 동해 연안의 특산품이라 할 만하다. 무른돌을 갈아 낚싯바늘의 긴 축을 만들고 여기에 뼈나 나무로 만든 고리를 붙여서 만들었는데, 동해 연안의 여러 신석기 유적에서 발견된다. 특히 문암리에서는 예술 작품 수준으로 잘 만들어진 특별한 석기들이 여러 점 나왔다.
또 문암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 얼굴 조각들도 ‘동풍 문화’라 할 만하다. 오산리 선사 유적의 심벌인 인면(人面) 토기뿐 아니라, 아무르강의 신석기 유적, 간도와 두만강 하구의 굴포리 유적, 부산 동삼동 유적 등에서도 사람 얼굴 조각이 출토됐다. 이 분포도를 보노라면, 동풍에 ‘얼굴 숭배 사상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문암리 유적에서 백두산 원산지로 추정되는 흑요석이 출토된 것도 이런 흐름의 증거다.
문암리에서 출토된 흑요석제 석기. 백두산 지역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공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물론, 선사시대에도 한반도 남북을 가로지르는 백두대간으로 인해 동-서 간 교통이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쪽에서 시작된 빗살무늬토기 문화는 동쪽으로 백두대간을 넘어 이동했는데, ‘동풍’ 덧띠무늬토기 문화는 서쪽으로 불지 않았을까? 왜 동쪽에서만 오래된 토기들이 보일까? 한반도 선사시대 연구의 화두들이다.
문암리에서 출토된 토기에서 식물 씨앗이 눌린 자국(노란 점)이 발견됐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신석기시대 어부도 농사를 지었을까?
서해안의 제3세대 토기 유적인 황해도 지탑리 유적에서는 불에 탄 조와 돌로 만든 농경 도구들이 발견되는 등 이미 기원전 4,000년 전에 초기 농경을 했던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이랑 밭이 발견된 적은 없다. 물론, 이랑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시 이랑짓기 농경 문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도 남해안 섬에는 어부가 뱃일을 하지 않는 시간엔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다. 신석기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문암리 유적에서 나오는 돌 도구 재료 중에는 수십㎞ 떨어진 곳에서 생산되는 것들도 있으니, 경제생활의 반경이 넓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산, 강, 호수 그리고 바다가 지척에 있는 이 지역은 어로와 채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 인구가 증가하면, 더 안정적인 생산 방식인 농경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문암리 오산리 등 동해안 이 일대의 유명한 신석기 유적에서는 중기 이후 분명 농사를 짓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실제로 송전리 유적에서도 흙덩어리에 조, 기장, 수수 등이 들어 있고, 팥의 흔적도 있는 등 곡물이 이미 일상적인 식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문암리 주거지 발굴 및 층위 단면 모습.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공
문암리 밭이랑, 경작 혁명의 흔적?
선사시대 밭에 이랑이 있는 모습은 발굴자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이랑과 고랑이 교차하는 광경은 선사시대의 멈춘 시간을 보는 듯한 감동을 일으킨다.
문암리 유적에서는 두 개 층에서 밭이랑이 발굴됐다. 위층의 이랑은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래층은 신석기 중기(기원전 3,600년~기원전 3,000년)의 주거지 1기가 밭이랑을 파고 만들어진 것으로 미뤄, 적어도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진 밭 유적으로 추정된다. 문암리 밭이랑이 발견되기 이전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밭 유적 중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은 청동기시대(기원전 1,500년~기원전 400년)의 밭 유적이었으니, 이보다 무려 2,000년이나 앞서는 이랑과 고랑 밭이 발견된 셈이다.
토기 표면의 눌린 자국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모습. 기장으로 추정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공
또 문암리에서는 불에 탄 콩이나 밀 종류의 종자, 도끼에 찍혀 있는 들깨 종자의 흔적, 그리고 탄화미가 한 알씩 발견됐다. 수수, 기장, 조 등 널리 재배됐던 곡물을 넘어선 곡물 종류다.
이렇듯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먼 시기의 신석기 어촌 유적에서 밭이랑 유구가 발견된 데 대해 논란이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석기시대 이랑 밭 농경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분석의 결과는 당시의 곡물 재배 범위나 기술이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석기시대는 단순한 채집과 사냥이 아닌, 훨씬 발전된 경제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 현대 고고과학은 구석기시대 동굴의 흙 속에서 유전자를 찾아 고인류의 모습까지 그려내고 있다. 더 나아가 문암리 사람들의 당시 생활을 더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길 기대한다.
배기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한양대 명예교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